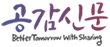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염보라 기자="책임지는걸 싫어하는 분입니다. 새로운 제안은 거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말씀 드리면 귀부터 닫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 한 금융단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수장인 A씨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누워서 침 뱉기인 발언이었다. 오죽하면 기자에게 하소연 할까 싶었다.
A씨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흔히 말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인사로 분류된다.
선입견이 무섭다고, 이날 이후 기자에게 관료 출신 인사에 대한 이미지는 'A씨'로 단단히 박혔다. 책임감이나 사명감이라고는 1도 없는, 퇴직 후 새로운 '먹거리'로 단체장을 맡은 '낙하산' 인사 정도.
고백하자면, 그 뒤로 이어지는 금융단체장 인선마다 관료 출신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를 때면 부정적 프레임을 한 겹 씌우고 바라봤다. 관료 시절 그들이 보여준 성과나 그가 쌓아온 평판은 그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순간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관피아'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라는, 사족을 붙여가면서.
물론 그 색안경은 벗겨졌다. 지난해 전 회사 대표를 따라 김광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마주한 자리에서다.(김 회장은 정통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으로, 현재 은행연합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다) 한 시간 남짓 했던 자리는 꽤 인상적이었다. 좋은 수장의 모습을 봤고 이는 1만 보고 100을 왜곡한 기자의 편협함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그가 회장으로 있었던 3년간 NH농협금융의 경영성과도 좋았다. 그 어느 때보다 호실적을 거뒀고 디지털 전환, 글로벌 확장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요즘 금융권은 '관피아' 논란이 한창이다. 김 회장을 비롯해 관료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금융협회·단체장 자리를 꿰차면서다. 안타까운 건 기자가 그러했듯 관료 출신 인사를 향한 비판이 무조건적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전관예우'를 위한 전관예우는 당연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편협한 색안경도 불필요하다. 중요한 건 민간이냐 관료냐의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업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반돼야 할 것도 있다. 색안경을 벗기기 위한 관료 출신 금융협회·단체장들의 노력이다. '관피아'라는 오명을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본인 자신에게 있는 따름이다. 명예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들의 임기가 끝나는 3년 뒤에는 '관료 출신'이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관피아라는 불명예스러운 용어가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