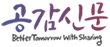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 이은철 공공정책부장] 역대 정권 출범 초기에 어김없이 등장했던 이슈가 공공기관 개혁이다. 박근혜정부 역시 집권 초부터 공공기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내걸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A부터 Z까지 손보겠다(현오석 전 부총리).”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인한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박근혜 대통령).” 이러한 각오에는 비장감까지 묻어났다.
방만 경영과 천문학적 부채(이유야 어찌됐던), 각종 비리와 끊이지 않는 뇌물파티 같은 만성적 도덕적 해이로 만신창이가 된 공공기관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데 누가 돌을 던지겠는가. 여전히 공공기관 부채는 해마다 늘어 이미 나라 빚보다 많아졌다.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일반기업과는 견주기도 어려운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이제는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초호화 사옥에서 ‘신의 영역’을 과시하고 있다. 오죽하면 해외 유력 신용평가사들이 ‘공공기관의 부채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을까. 이대로 가다간 공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경제를 거덜 낼 것이란 위기의식은 당연하다.
탄광노조의 과도한 인금인상 요구에 맞서 그들을 굴복시킨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 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엄중히 물어 공항관제사 1만여명을 해고한 로날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처럼 단호하고 과감한 개혁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역대 정권들이 그랬듯 흐지부지 또다시 미봉책으로 끝난다면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수차례 개혁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신의 영역을 인간이 개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자조 섞인 비아냥이 말하듯 공공기관 개혁은 선별적·순차적으로 민간영역에 돌려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게 강한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기업 개혁을 하려면 단순히 부채를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근시안적 방법은 안 된다. 독점이 필요 없는 기관은 과감히 민영화를 추진하고 역할을 다한 기관은 청산해야 한다. 한전에서 독립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된 전력회사들을 민간과 경쟁시키고 민간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분야의 공기업은 없애야 한다.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
- 기자명 이은철 공공정책부장
- 입력 2015.03.16 14:27
- 댓글 0